오랜만에 걷기에 나선다. 집에서 멀지 않은 성남 누비길 제1구간을 걸어볼 요량이다. 도시는 아직 두터운 어둠의 이불을 덮어쓰고 있다. 미명의 새벽에도 정류장이나 전철역에는 어김없이 버스와 전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먼길 떠나는 사람들은 마음이 바쁠 것이다. 우리도 때때로 설레거나 두려운 마음으로 먼 곳으로 발을 내디딜 때가 있다.
전철 안은 온통 검은색 롱 패딩을 입은 사람들 일색이다. 모란에서 전철을 타고 태평과 가천대를 지나 복정에서 내렸다. 안내지도를 보니 누비길은 남한산성길, 검단산길, 영장산길, 불곡산길, 태봉산길, 청계산길, 인릉산길 등 성남 시계(市界)를 따라 62.1km 7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누비길이 시작되는 서울과 접한 복정동 성남대로 옆에 시조 탑(市鳥塔)이 서있다. "성남에 고향을 심자"라 탑신에 적힌 문구가 막무가내식 이주 도시 성남의 아픈 역사를 어렴풋이 말해준다. 성남은 1960~70년대 서울 빈민들을 집단 이주시키기 위해 당시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 지역에 조성한 '광주대단지'에서 시작된 수도권 최초의 계획 위성도시다.


그 뒤 1990년대 초 분당 신도시가 들어서고 뒤이어 2000년대 초부터 판교신도시가 들어서며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거대 도시가 되었다. 탑신 위 까치 조형물은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날아오르려 하고 있다. 분당으로 이사한 지 20년이 다 되었으니 성남은 내게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다.
앱 지도를 따라 1코스 시작점 복정동 행정복지타운으로 향한다. 야트막한 언덕 위 '선한 목자교회'는 성탄절을 앞둔 주일이지만 이른 아침이라 고요하다. 문을 여는 빵집에서 바게트 빵 냄새가 새어 나오고, 가로수는 몇 남지 않은 잎사귀를 두어 개 떨구고, 까치들은 여기저기에서 깍깍거리며 격하게 반긴다.
마트 커피숍 헤어샾 부동산사무소 휴대폰 매장 동물병원 빵집 철물점 안경점 떡집 식당 가구점 스크린골프장 등이 줄지어 선 거리, 그중 간간이 눈에 띄는 순대국밥집이 자꾸 유혹하지만 아직 걷기 초입이라 타이르며 발을 옮긴다.
다가구 주택들이 반듯하게 구획 지어 들어선 이면도로 골목길을 따라 한참 걷는다. 벽돌이나 대리석 외벽의 주택가는 유럽의 어느 나라 거리에 들어선 듯 이국적이다.
앱을 따라 길을 잡다가 동서울대학 부근에서 20여분 넘게 맴돌다가 복정초교 좌측 산자락의 누비길 입구를 겨우 찾았다. K*앱을 아무 의심 없이 믿은 탓이다. 길을 나선 나그네에게 이정표는 요긴한 길잡이다. 그렇지만 가짜가 넘쳐나는 세상이니 이정표인들 잘못된 것이 한 둘이랴.
바른 이정표는 길을 쉽고 빠르게 안내하지만 틀린 이정표는 곤궁에 빠트리고 소중한 시간과 힘을 앗아가기도 한다. 좋은 스승이나 친구가 가까이 있는 인생은 축복이다. 그런 스승이나 친구가 가까이 없다면 만세 사표로 불리는 성인들의 말씀을 인생의 이정표로 삼아도 될 터이다.



수북이 깔린 갈색 참나무 잎사귀 위에 새벽에 내린 진눈깨비가 흩뿌린 하얀 소금처럼 녹지 않았다. 동서울대 뒤쪽 능선을 따라 영장산으로 향한다.
산줄기 아래 안긴 동네 뒤로 위례신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안골 고개 부근에는 고려와 조선조의 문신들과 조선조 왕자 등의 유택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완만한 산등성이를 등지고 앞쪽으로 아늑한 조망이 펼쳐진 곳,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명당은 누가 보아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성싶다.
잔뜩 흐린 하늘은 금방 눈이라도 쏟아부을 것 같다. 긴 나무계단을 지나 산불감시탑이 있는 영장산 봉우리에 올라서니 몸에 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한다. 태양은 구름에 갇혀 달무리처럼 흐릿하다.
성남과 광주시 경계에 있는 해발 413.5m 영장산과 이름이 같은 영장산은 청량산이 서남쪽으로 뻗어내리다 솟은 해발 193미터 봉우리로 정상 아래쪽에 망경암(望京庵)이 자리한다. 고려말부터 조선초까지 역대 임금들이 친히 찾아와서 나라와 백성의 평안을 기원했던 곳이라 한다.
가천대 교정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마애여래좌상이 있다는 망경암으로 내려가서 경내를 둘러보았다. 목탁소리가 들리는 대웅전 측면 문 앞에 불자들 신발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미륵전에는 보살님 두 분이 연신 절을 올리고 있다.
대웅전 옆 암벽 미륵전 통유리창 밖으로 보여야 할 마애여래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도 보이질 않고 음각한 비문들만 보일뿐이다. 마침 오늘이 동지인지라 삼성각, 탑, 수령 200년 된 느티나무 등 주변에는 공양물로 올린 팥죽이 놓여 있다.


영장산 정상으로 다시 올라설 즈음 열 시가 훌쩍 넘었지만 빨리 멀리 가려고 나선 길이 아니라 마음은 오히려 느긋하다. "지금, 어떤 결정도 하지 말고 멈추세요."라고 적힌 자살예방센터에서 세운 푯말이 눈길을 잡는다.
작은 체육공원을 지나 솔길을 걷지만 공기에서는 텁텁하고 눅눅한 냄새가 난다.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신조어에 따르자면 오늘은 미세먼지가 심한 사미에 해당되나 보다.
산성역 사거리로 난 헌릉로 고개 위에 놓인 인도교를 지나면 인공폭포와 조각공원이 맞아준다. 잔디밭에 '기다림', '동심', 그리고 '또 다른 길'이라는 제목의 조각상이 조용히 자신들의 얘기를 들려준다. 오른쪽 능선 아래 쭉쭉 곧게 뻗은 소나무들이 가지치기로 잘려나간 상처에서 허연 송진 자국을 눈물처럼 줄기로 흘러내렸다.
성남시와 위례신도시를 경계 지으며 서남쪽으로 길게 뻗어 내린 청량산 줄기를 따라 많은 산객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앞서 걷는 산객들은 블랙아이스 때문에 일어난 버스와의 차량 충돌사고 얘기를 실감 나게 주고받는다. 뒤쪽 노산객은 동행에게 남북관계를 자신만의 논리로 풀어놓는다.
평소 기행으로 겉멋만 잔뜩 든 사람으로 오해했던 작가 이외수,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춘천 거지'로 불리던 그의 젊은 시절 발자취를 보고,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내가 간 길이 곧 내 인생"이라던 그의 말에 공감했었다. 이유 없는 무덤 없듯이 사연 없는 인생도 없을 것이다.
조망쉼터는 관악 북한 도봉이 보인다는 안내판과는 달리 코앞 잠실의 L빌딩과 하얀 연기를 내뿜는 높은 굴뚝만 모네 특유의 수채화처럼 흐릿하게 보일뿐이다. 그 위쪽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물품을 날랐을 '보부상들이 다닌 길'이라는 안내판 옆을 산객들이 연신 빠르게 지나친다. 누비길 능선 옆 아스팔트 길에는 버스와 승용차들이 꼬리를 물고 오르내린다.



지화문 1km여 못 미쳐 조선 후기 문신 서응명, 홍익필, 이명중을 기리는 불망비가 바위에 새겨져 있다. 그 옆 볕바른 곳에는 노년으로 접어든 산객 열댓 분이 자리를 틀고 앉아 이른 점심을 들고 있다. 멀리 왼쪽으로 가파른 궤도를 오르는 청룡열차처럼 청량산 능선을 따라 이어진 산성이 눈에 들어온다. 옛 산성매표소 정류장 포장마차에서 어묵과 국물로 언 몸과 허기를 달래 본다.
정오가 훌쩍 지나서 누리길 제1코스의 종점인 남한산성의 남문 지화문과 마주했다. 검단산 쪽으로 가다가 작은 절집 상도사를 거쳐 산성 체육공원으로 내려섰다.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스한 햇볕을 즐기고 있다.
모 협회에서 나눠주는 팥죽을 한 그릇 받아 들었다. 어릴 적엔 팥죽 새알심을 먹으며 키재기 하듯 한 살 더하는 것을 좋아했었다. 액귀와 병마를 쫓는다는 동짓날 팥죽에 담긴 의미, 그래도 이젠 나이 한 살 더 먹는다는 건 왠지 사양하고 싶은데.. 옛사람의 시가 절로 입 안에서 맴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 <歎老歌>, 우탁(1263~134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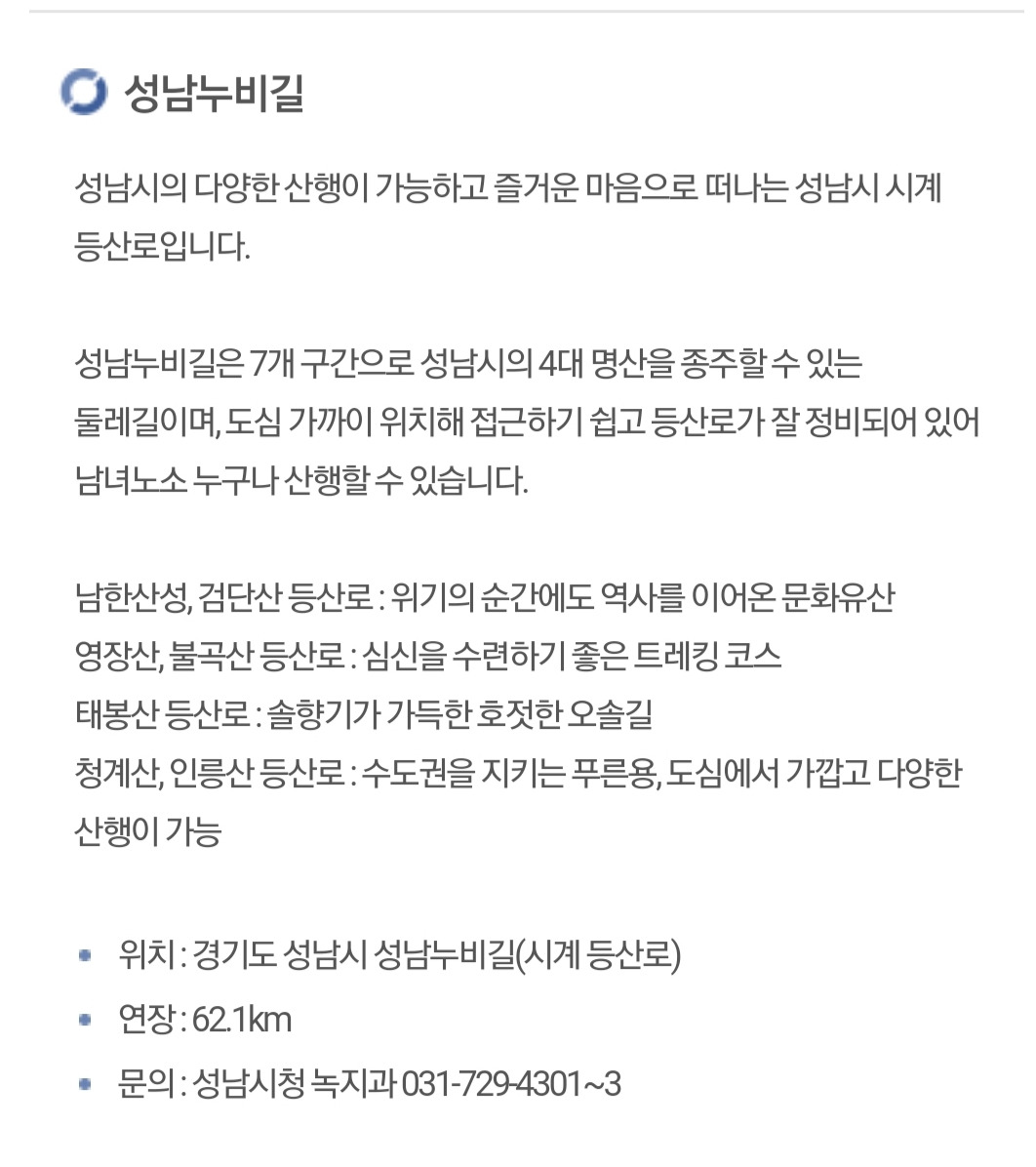

'길 위의 시시포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관령 너머 관동으로 (3) | 2024.09.03 |
|---|---|
| 부산에서 미켈란젤로를 만나다 (1) | 2024.09.03 |
| 무을 기행 (3) | 2024.08.31 |
| 부산 동래 온천장 탐방기 (0) | 2024.08.21 |
| 감천, 고달픈 현실 달콤한 꿈 (0) | 2024.08.21 |